
[명예의 전당] Earth, Wind & Fire - That's the Way of the World
Side One
01. Shining Star
02. That's The Way Of The World
03. Happy Feelin'
04. All About Love
Side Two
05. Yearnin' Learnin'
06. Reasons
07. Africano
08. See The Light
* 롤링스톤지 선정 "위대한 명반 500선(The 500 Greatest Albums of All TIme)" - 493/500
과거의 펑크(Funk) 밴드를 꼽아보라면, 갭 밴드(Gap Band)나 쿨 앤 더 갱(Kool & the Gang),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Sly
& the Family Stone) 등의 그룹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아마도 가장 많은 표는 어스 윈드 앤 파이어(Earth, Wind & Fire, 이하 'EWF')를 향할 것이다. 이들의 음악을 단순히 '펑크'라는 범주에 한정시키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 싶지만, 어쨌든 펑크 밴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소울, 알앤비, 디스코의 영역까지도 유연하게 확장되는 그들의 음악적 스타일은 그들의 전성기였던 70년대의 펑크 중심의 흑인음악사를 설명할 때 대단히 유용할 수밖에 없다. 한 시대를 대표했던 밴드였던 만큼 수많은 명작을 남겼음에도,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역시 그들의
출세작인 [That's the Way of the World]다.
물론 본 음반이 나오기 직전까지 발표되었던 "Mighty
Mighty"나 "Evil"과 같은 70년대 초의 싱글들의 상품성도 충분했으나, 흑인 음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흑인 채취가 너무 진해
타 인종들에게서는 설득력을 갖지 못해 파퓰러 뮤직의 핵심 요소인 '대중성'을 갖추진 못했던 곡들이었다. 이렇게 EWF는
데뷔하여 여러 장의 앨범을 발표하면서도 탑텐 싱글이나 탑텐 앨범 하나 배출하지 못했던 평균치의 펑크 밴드였다. 딱히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않은.
그러나 1975년도에 발표된 [That’s the Way of the World]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작품이었다.앨범에선 다양한 수록곡들이 히트를 기록했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곡은 기존의 대중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 “Shining Star”였다. 이전까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팝적 요소가
듬뿍 가미된 "Shining Star"는 싱글 차트와 앨범 차트, 양 진영에서 모두 넘버원을 기록하는 기념비적인 역사를 기록했다. 펑크라는 그들의 음악적 아이덴티티는 여전히 유효했지만, 청자들의 인종과 무관하게 제압하는 멜로디와, 세련미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또한 지금의 음악적 감성을 대입해 보아도
어떠한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으니, 당시에는 대중들의 즉각적인 동요를 일으켰을 엄청난 문제작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본작이 무한정 팝으로의 수렴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That’s Way of the World] 이전까지 EWF 사운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Africano"는 보컬을 제외한 단순 연주만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명쾌히 이해시켜주며, "Happy Feelin'"는 "Shining
Star"와 마찬가지로 대중성과 자신들의 정체성 사이의 적정 타협점을 찾아내 보인다. 약간
몽롱한 분위기로 세련된 분위기를 유지하는 "That's The Way of the World"와
불멸의 명곡 "Reasons"는 환상적인 소울 넘버로 굳이 펑크가 아니더라도 흑인
음악의 스펙트럼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한번 각인시킨다. "Reasons"에서
곡을 관통하는 필립 베일리(Philip Bailey)의 팔세토는 묘기에 가까울 정도로 환상적인데, 덕분에 본 발라드 곡에 내포되어있던 섬세한 감성은 적나라하게 표면화된다.
본작은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있는 게, 팝적인 요소의 확장과, 어떻게 보면 이를 대립하는 요소인 그들의 정체성 혹은 펑크의 에센스를 지켜내려는 두 세력의 영역 싸움이 조화롭게
버무려져 있다. 보는 시점에 따라서는, 흑인 뮤지션 본연의
소울과 백인적인 감성의 배합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비추어 봤을때, 흑과 백이라는 두 가지 색으로만 표현된 본 작품의 앨범 자켓은 대단히 흥미롭다. 앨범 커버속 멤버들의 모습은 그들의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백인과 흑인, 아니 어떠한 인종에게도 환영 받을 수 있는 보편성과 대중성을 갖춘 작품이라는 대담한
메시지는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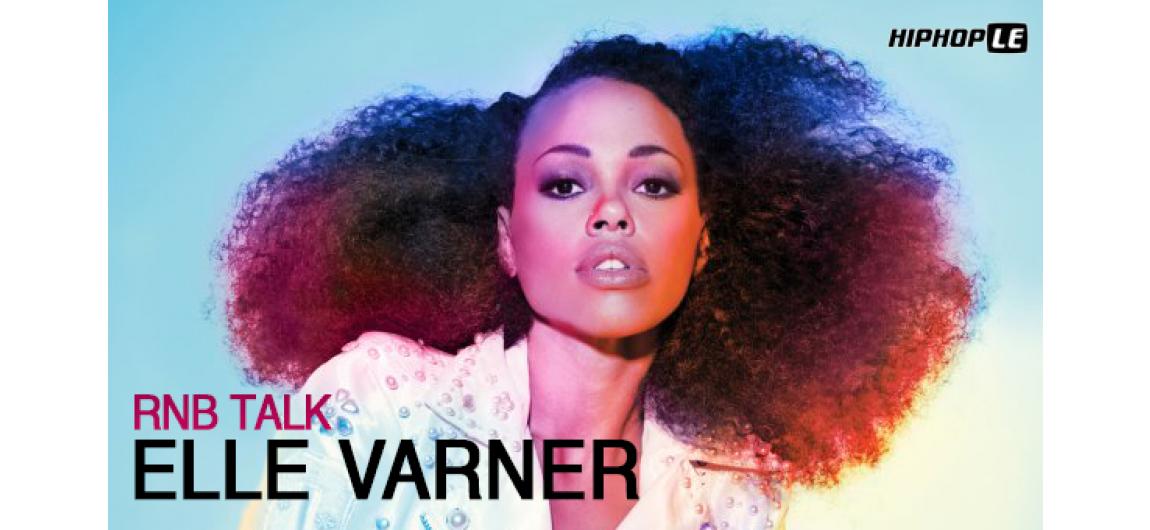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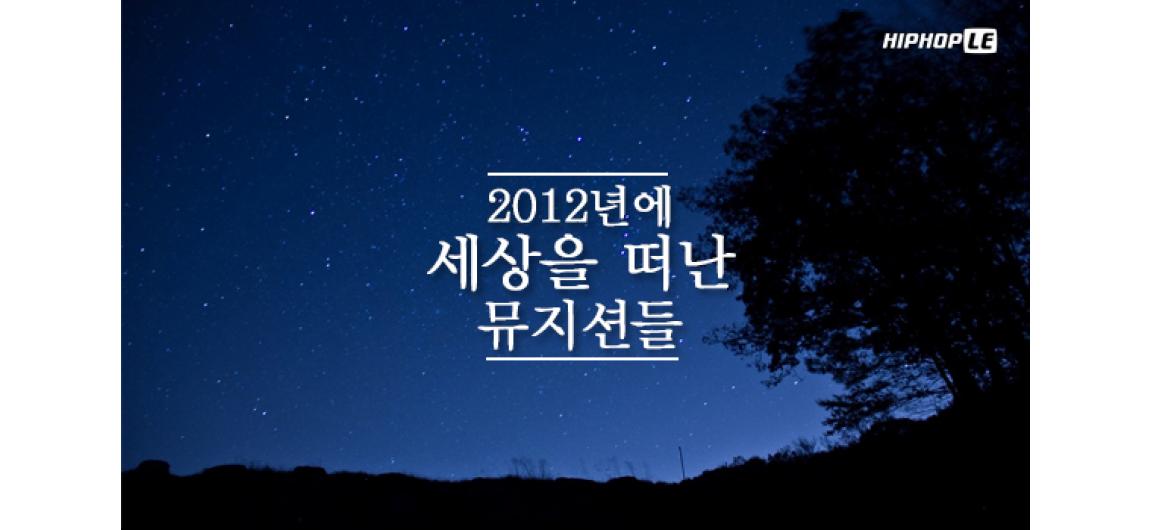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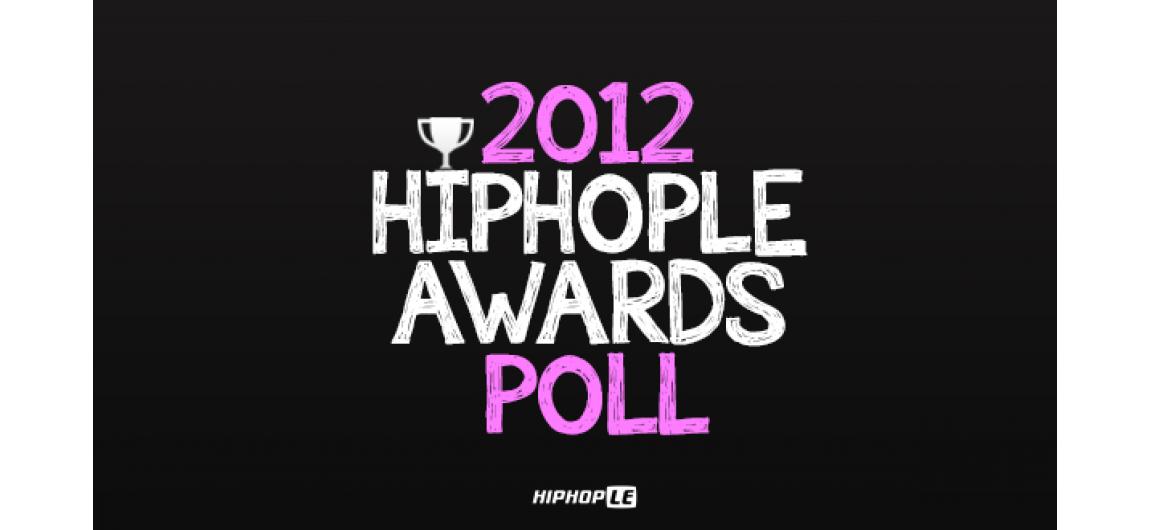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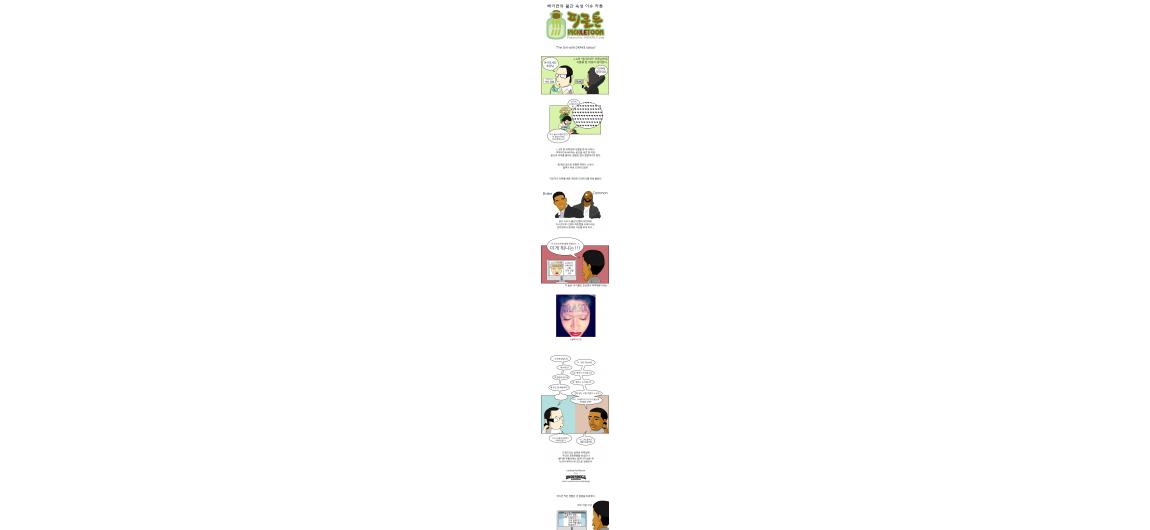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