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LE’s Essay: Muggle's Cruel Spring
봄은 여러모로 희한한 계절이다. 화창해지는 날씨와 따스한 봄기운에 누군가는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극히 내 입장에서 봄은 혼동을 주는 계절 그 자체다. 연초에 다짐했던 새로운 각오들과 이성으로 묶어낼 수 있는 여러 생각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와중에, 많은 이들을 홀리게 하는 그놈의 봄 내음이 머릿속으로 들어와 기이한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감정 혹은 감성이라는 말 따위로 불리는 무언가가 끼어들어서일까? 마치 가까스로 이별을 지워내고 일으킨 삶에 불현듯 헤어진 이와의 추억이 비집고 들어오듯 만감이 교차하는 끝에 얻는 것은 고작 우울감뿐이다. 아니면 모든 걸 다 삐뚤게 바라볼 만큼 돌아올 수도 없을 만큼 삐딱선을 타버렸다거나. 남들 다 하하호호하는 와중에 이렇게 되어버린 원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어쩌면 여러 갈래로 다가오는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20대 중반으로서 느끼는 강박이 내 온몸을 뒤덮는 것 정도는 그런대로 일리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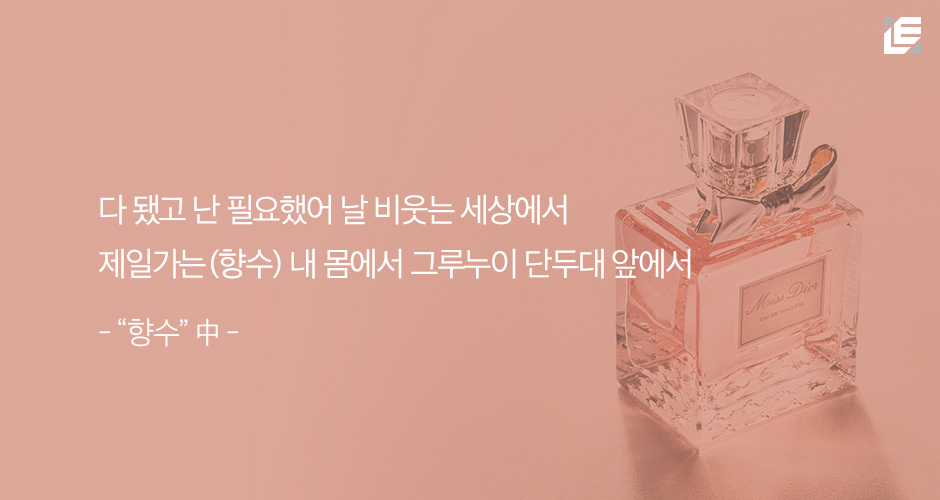
언제부터였을까?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기방어라는 습관 아닌 습관이 생겼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해선 안 되고, 빈틈을 보여주는 것은 더더욱 안된다는 강박. 아마 나의 빈틈이 언제든지 상처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익힌 까닭에서 일 것이다. 우리네 현실이 만들어낸 올바른 사회인 상에 내가 썩 그럴듯하게조차 충족하지 않는 거 같아 그 결점을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됐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에겐 향수가 필요하다. 우월감에 취하게 하고, 사람들을 꼬이게 할 고급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비웃음을 당하지는 않게 만들어 줄 향수. 어느샌가 난 그런 거로 풍미가 더해지기를 갈망했다. 누군가에게는 재력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실력 혹은 명예가 될 수도 있는 일종의 방패 정도라고 해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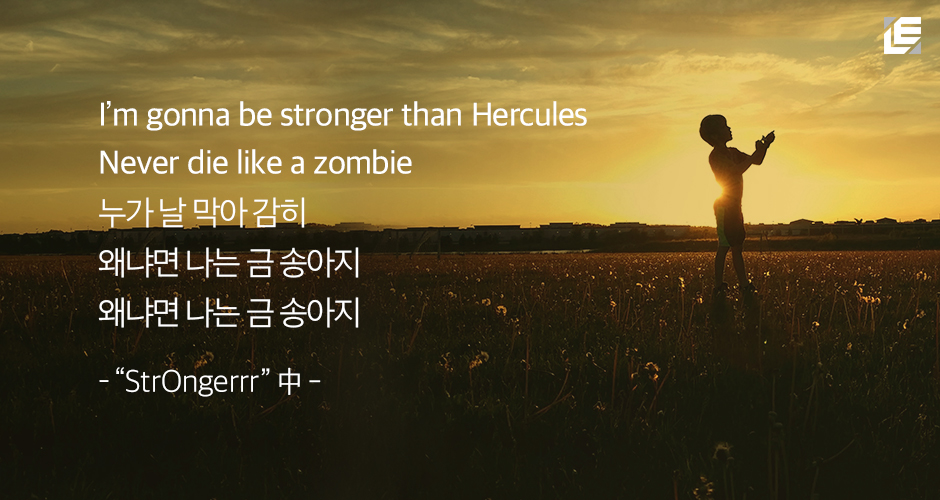
하지만 기어이 얻은 조금은 싸구려틱한 향수의 향기는 늘 금세 달아나고야 말았다. 그럼 이젠 어쩌나? 내 몸을 휘감을 수 있는 걸 가질 수 없다면 '난 괜찮아.'라는 말을 되뇌며 자기최면에 빠질 수밖에. 단단한 다짐과 허언으로 점철된 허세 사이의 자기최면은 흡사 세상을 내저버린 데스페라도인양 구는 중2 때의 모습을 떠오르게도 했다. 그래도 이만큼 나를 보호해주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게 또 어디 있을까. 누군가의 손발을 저릿하게 하고 싶진 않아 지나치게 티 내지는 않았어도 매번 '나는 해낼 것이다'라는 말에서 출발하는 자기최면은 항상 내 안에 놓여 있었다. 가끔은 스스로도 오버다 싶을 때가 있었으나, 그 정도는 애교로 못 본 척 눈감아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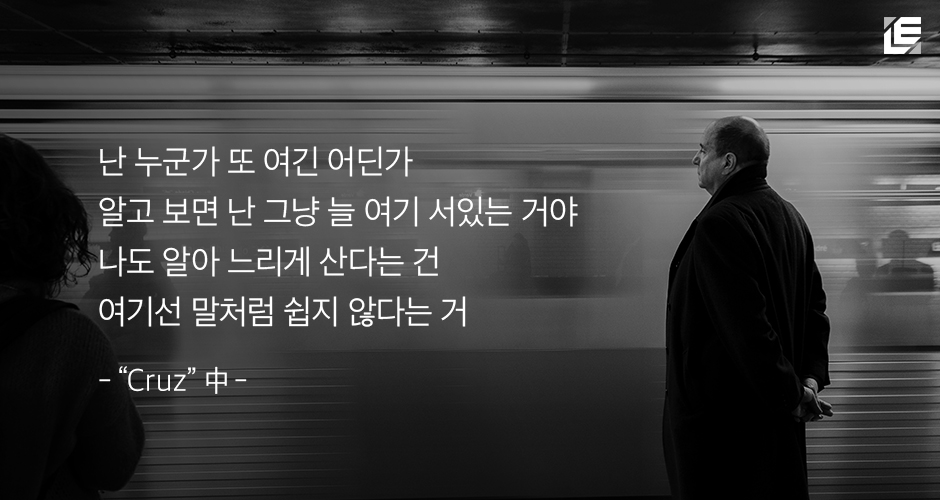
그 방어체계는 방파제가 파도가 넘실대긴 해도 육지를 집어삼키지는 못하게 하듯, 언제나 굳건했다. 문제는 캣닛 향을 맡은 고양이마냥 봄만 되면 나를 스르르 녹이려 한다는 것이다. 따스한 봄 향기는 나에게 조금은 쉬라 말하고, ‘네 속의 강박은 잠시 묻어두고 나를 즐겨봐’라고 유혹하는 것만 같다. 버스 창 밖으로 보이는 꽃들, 왠지 모르게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 닫힌 버스 창문이 나와 바깥 세상을 분리해놨어도, 봄이 보여주는 따스함과 아늑함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잠시동안 그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애초에 내가 누군지도 모를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아닐까?'. 버스 안이 아닌 벚꽃잎이 떨어진 길가여도 그 안일하다면 안일한 생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결론은 매번 ‘지금만큼은 쉬면서 느리게 살고 싶다. 고립감에서 벗어나 저 사람들과 같은 표정을 짓고 싶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느리게 산다는 건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쉽지 않았다. 아니, 거의 불가능했다. 느려지고 싶고 쉬고 싶었던 나와 현실 사이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화창한 봄 날씨와 만개한 꽃들은 괘씸하게도 오히려 그 간격을 넓히기만 했다. 그 와중에 성공 같은 이름을 단 향수에 대한 갈망은 불안감으로 변신해 찾아왔다. 이래서 아이유(IU)도 "팔레트"에서 "이상하게도 요즘은 쉬운 게 좋다"고 한 걸까. 스물다섯에 숫자 하나를 더했음에도 나는 그녀처럼 세상 이치에 맞게 일찍 철들지 못하고 다시금 우울감에 빠지기만 한다. 이제는 그 감정조차 나에게 코웃음 치며 비웃는 것만 같다. 왜 또 나를 불렀느냐며.

그래서 나는 봄이 싫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이 계절을 난 힘껏 즐기기는커녕, 우울의 구렁텅이로 빠지기만 하니까. 허나 봄은 무심하게도 매년 꽃들과 함께 찾아오고, 올해도 나에게는 똑같이 잔인하게 굴었다. 마음 가득 품은 화를 풀 데가 없으니 반격을 하려야 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날씨와 기상청에게 핀잔을 주는 이들처럼, 나도 괜스레 봄 탓을 하고 싶다. 그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에 드리운 이 빌어먹을 먹구름이 온전히 다 나 때문에 생긴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까. 비겁하지만 그 약간의 책임 회피는 좋은 향수는 못 되어도 좋은 방파제는 될 수 있으니까. 뭐 잘한 게 있냐만,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런 나라도 즐길 수 있는 따뜻한 봄이 오지 않을까? 그때쯤에는 더이상 봄 탓만 하지 않고 이 계절에 그간 묵혀놨던 사과 몇 마디를 건넬 수 있을 거 같다. 아직까지는 벚꽃은 졌지만, 채 가시지 않은 봄의 향기에 할 수 있는 말이 '나는 그래'라는 자조 섞인 말뿐이다. 그리고 만약 2017년, 당신의 봄도 그랬다면 '나도 그래'라는 위로 아닌 위로의 한마디를 던져본다.
글ㅣLoner
이미지ㅣay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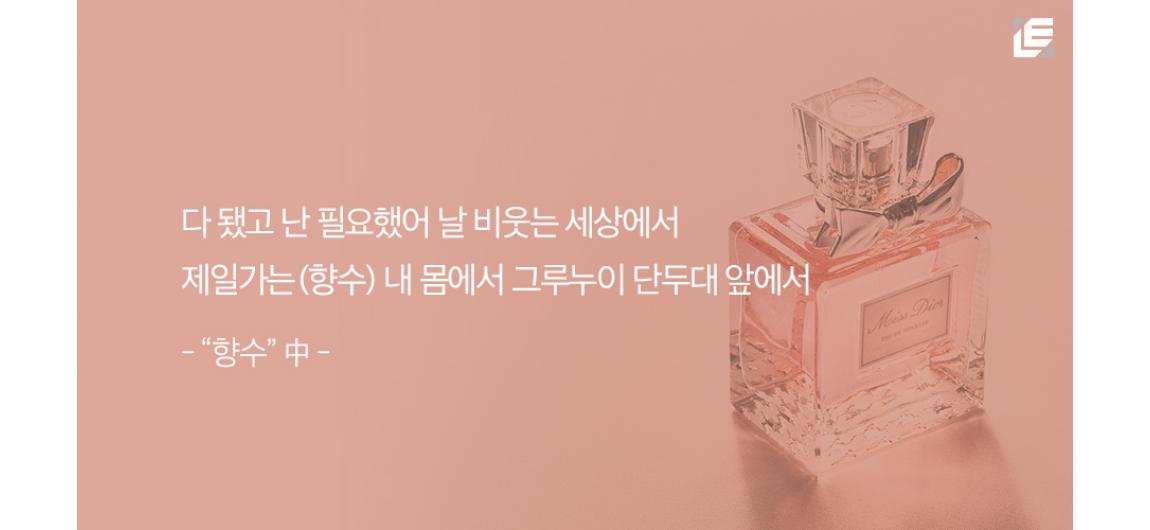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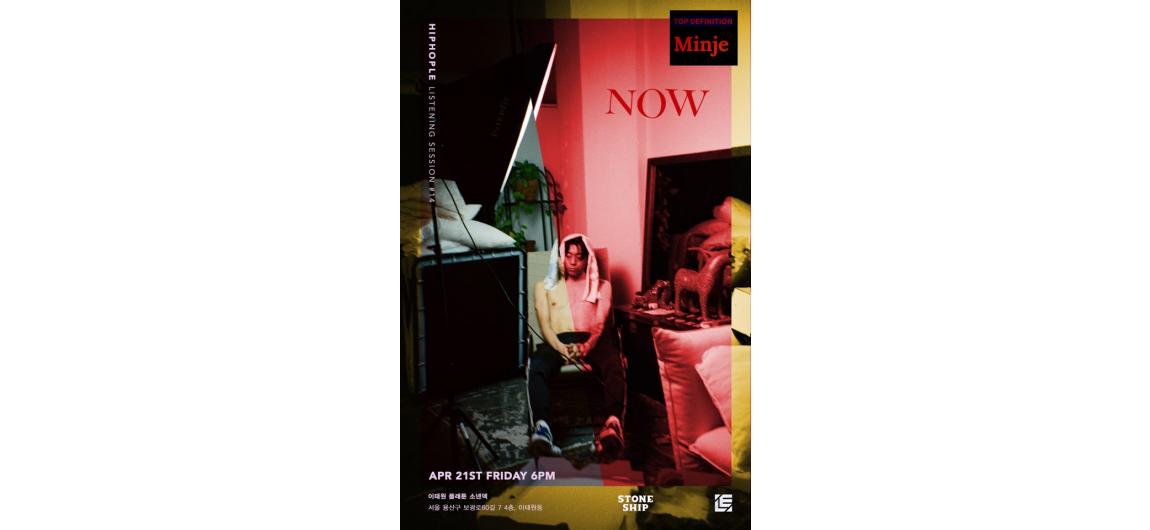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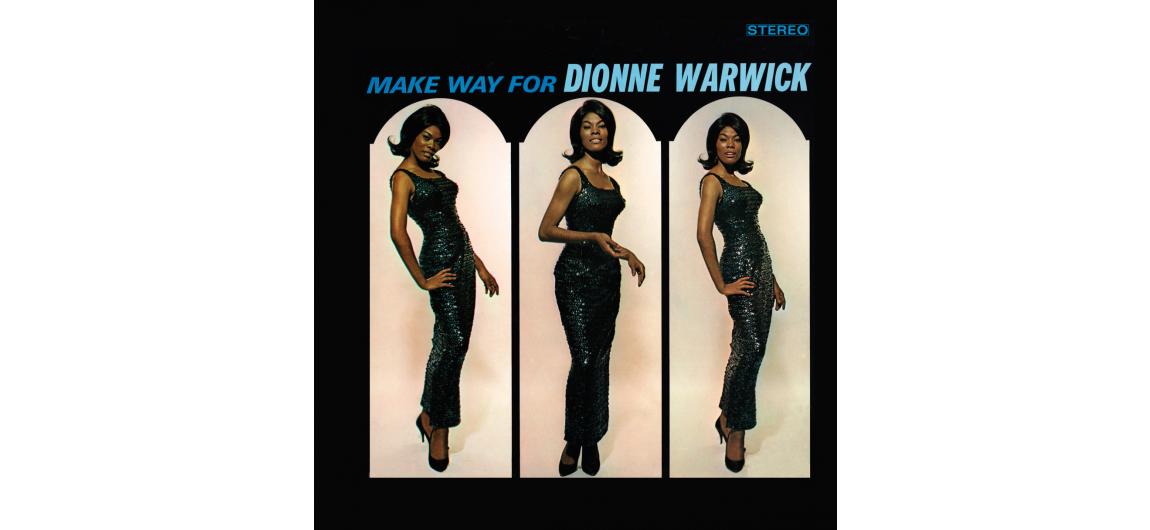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