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힙합엘이(HiphopLE)의 매거진팀은 격주로 일요일마다 오프라인 회의를 한다. 회의에서는 개인 기사에 관해 피드백하며, 중·장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체크하기도 한다. 열띤 논의 끝에 회의를 마무리할 시점이 오면 그때부터는 특별하다면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지난 2주간 에디터 개인이 인상 깊게 들었고, 다른 팀 멤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노래를 소개하고, 하나씩 감상한다. 처음에는 그저 각자의 취향을 공유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이 작은 습관은 실제로 서로 극명하게 다른 음악적 성향을 알아가며 조금씩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들의 취향을 더 많은 이와 공유하기 위해 <2주의 선곡>이라는 이름의 연재 시리즈로 이를 소화하기로 했다. 가끔은 힙합/알앤비의 범주 그 바깥의 재즈, 훵크 등의 흑인음악이 선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조차도 아닌 아예 다른 장르의 음악이 선정될 수도 있다. 어쨌든 선정의 변이라 할 만한 그 나름의 이유는 있으니 함께 즐겨주길 바란다. 열 명의 식구가 함께한 4월의 두 번째 매거진팀 회의에서 선정된 열 개의 노래를 소개한다.
예인 - Cry
누구나 울 때가 있다. 기뻐서 울기보다는 슬퍼서 울 때가 더 많을 것이며, 눈물의 원인 중에서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비롯될 때가 많을 것이다. 보통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나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니까.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업무나 현실 때문에 울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감당 못 할 일을 만들거나 하겠다 해놓고 못 할 것 같은 상황은 이제 없다. 그저 처음 계획했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 일이 나의 통제 외의 변수를 맞이할 때, 그것이 가끔 분하고 억울할 정도로 클 때 그런 감정이 나타나는 것 같다. 항상 감정은 감정이지 상황이 아니라는 것, 감정으로 상황이 바뀌진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감정에게 눌릴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정말 이 노래 가사처럼 ‘I don’t know what else to do’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태어날 때 빼고 울어본 적이 없다는 더콰이엇(The Quiett)이 멋지고 부럽다. 그와 별개로 예인(Yein)의 신곡 "Cry"는 정적인 순간으로부터 감정의 응집을 담아내고, 세련된 후렴에서 억제된 감정이 어떤 틈 사이로 삐져나오는 느낌을 담아낸다. 예인의 특정이 감정의 응집이라고 하면, 영채널(0channel)의 프로덕션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요즘 같이 바람이 세게 부는 때에 듣기 좋은 노래다. - bluc
Nas & Ginuwine – You Owe Me (Midas Hutch Remix)
집에서 책상에 앉아 마감할 때면 흘러오는 음악들이 더욱 좋게 들린다. 가끔 흥겨운 노래가 나오면 마감이고, 뭐고 잊어버리고 어깨춤을 추곤 한다. 최근에는 마이다스 허치(Midas Hutch)의 음악에 혼을 뺏겨 잠시 정신줄을 놓았는데, 다들 그 흥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선곡해보았다. 마이다스 허치는 프로듀서 겸 DJ로 활동하는 FS 그린(FS Green)의 다른 프로젝트 활동명이다. 그의 음악은 세련된 훵크/디스코에 가까운데, 듣고서는 엉덩이를 가만두지 못할 정도로 남다른 훵키함을 자랑하는 편이다. “You Owe Me (Midas Hutch Remix)” 역시 마찬가지다. 세련된 디스코로 편곡해서 원곡보다 더한 흥겨움과 감흥을 선사한다. 원곡은 팀발랜드(Timbaland)가 프로듀서로 참여해 누가 들어도 팀발랜드스러운 타악기 사용이 돋보이는 편인데, 이 점을 비교해서 들으면 재미있을 듯하다. - Geda
기리보이 (Feat. 죠지) - 졸업
사운드가 좋아서 들었는데, 기리보이(Giriboy)였고, 피셔맨(Fisherman)이 프로듀싱을 맡은 곡이었다. '저 구름 뒤로 멀리'라고 하길래 행복한 노래인 줄 알았더니, 또 말 그대로 학교를 졸업한다는 뜻의 제목인 줄 알았더니, 인생을 졸업하는 내용의 곡이었다. 이 곡에서 기리보이는 자살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낸다. 동그랗게 매달린 밧줄이 목걸이 같다는 식의 표현은 섬뜩하지만 동시에 이전의 기리보이식 작사법을 떠오르게도 한다. 그래서인지 무거운 우울함이나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박함을 느끼기는 어렵다. 프로덕션도 죽음을 연상케 하는 어두운 무드도 아니고, 더군다나 죠지(George)의 보컬도 그런 무드와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존재하는 것 자체가 슬프다는 그 가사 한 줄이, 살아 있는 건 아픈 상처 같다는 그 가사 한 줄이 마음 한편을 아리게 한다. - Loner

Xuefei Yang – Gente Humilde
지금 사는 건물이 방음이 좋다고 생각했다. 올해 초, 이사해야 했을 때 같은 건물에서 알아본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사할 때가 되니 옆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 방음이 좋아서 그들이 내가 듣는 음악을 못 들었던 게 아니라, 그냥 내게 말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오디오로 음악을 듣는 데 소극적으로 변한 이유다. 특히, 밤에 더 그렇다. 밤에는 가급적 잘 안 듣는 편이기는 한데, 가끔 음악을 틀어야 할 것 같은 때가 있다. 보통은 솔로 피아노 연주곡을 듣곤 했는데, 피아노는 생각보다 저음이 많이 울린다.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택한 게 솔로 기타곡이다. 클래식 기타는 볼륨만 잘 조절하면 남에게 피해를 줄 일도 없다. 이럴 때마다 슈페이 양(Xuefei Yang)이 브라질 음악을 담은 [Colours of Brazil]은 늘 내게 모범답안이었다. 에이토르 빌라 로보스(Heitor Villa-Lobos) 같은 브라질 현대음악가부터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Antonio Carlos Jobim) 같은 보사노바 음악가의 곡까지, 구성이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자주 듣는 곡은 가로토(Garoto)라는 예명으로 조금 더 잘 알려진 아니발 아구스토 사르디냐(Anibal Augusto Sardinha)라는 음악가의 “Gente Humilde”다. 스페인어로 ‘겸손한 남자’라는 의미인 거 같은데, 작곡 동기나 의미는 잘 모르겠다. 그저 슈페이 양이 연주하는 클래식 기타 소리가 정말 투명하고 아름답다고 느낄 뿐이다. 2016년 11월, 서울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한국을 찾았을 때 내가 공연장을 갔던 건 그런 소리를 직접 들을 거란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역시나 그런 모습이었다. - 류희성
Michael Giacchino - The Master of the Mystic End Credits
마블(Marvel) 빠로서 부끄럽지만,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를 최근에야 보았다. 여러모로 아주 만족스러운 영화는 아니었지만 의외의 소득이 있었다. 바로 음악이었다. 극중 의사였을 당시의 스트레인지는 팝 음악 애호가로 나온다. 수술 집도 중에 듣는 척 맨지오(Chuck Mangione)의 "Feel So Good", 핑크 플로이드(Pink Floyd)의 "Interstellar Overdrive"와 같은 곡들이 그의 취향을 잘 보여준다. 이후에 수련을 받으며 종종 에미넴(Eminem), 드레이크(Drake), 아델(Adele) 등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비욘세(Beyonce)의 노래를 몰래 듣는 장면은 애교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영화의 메인 테마곡이었던 "The Master of The Mystic End Credits"였다. 인간 세계에서 초월 세계로 넘어오는 스트레인지는 물론, 영화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었다. 같은 멜로디의 음악이 '의사' 스트레인지 구간에서는 피아노로 연주되지만, 초월 세계의 스트레인지 구간에선 하프시코드(14세기경 이탈리아, 플랑드르 지역에서 고안된 현을 뜯어 소리를 내는 건반 악기)로 연주된다. 같은 인물이지만 세련된 의사와 고전적 마법사의 모습을 다른 악기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동양적인 정신 세계와 고전적인 마법 세계가 중심이기에 기존의 슈퍼히어로 영화에서의 웅장한 오케스트라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이 한스 짐머(Hans Zimmer)가 아니라 영화 <업>의 음악 감독이었던 마이클 자키노(Michael Giacchino)라는 걸 알고 나면 저절로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영화는 언제나 그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많은 작업 끝에 삽입되는 음악들이야말로 숨겨진 재미 요소이다. 마치 마법 세계의 그것처럼 말이다. - Limpossible
프라이머리 & 안다 - Dressroom
성격이 좀 꼰꼰대는 편이라 균일하고 정갈한 걸 좋아한다. 그렇다고 인간 시계에 가까웠다는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처럼 생활 양식까지 그렇진 않다. 대신 콘텐츠를 보고 만들 때는 그 정도가 좀 병적이다. '내가 좀 완벽주의자야'라고 하면서 젠체하고 삐대려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게 명쾌하게 보이지 않는, 아무리 해도 한 줄로 정리되지 않는 콘텐츠는 못 만든 콘텐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려면 본인만이 온전히 이해하는 내 안의 중2스러운 자의식을 200%로 터뜨릴 게 아니라 그 자의식을 어떤 형태로 포장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프라이머리(Primary)는 그 점에서 내게 여전히 매력적인 프로듀서다. 예술혼을 불태운답시고 그냥 막무가내로 새 음악을 내는 게 아니라 예쁜 모양으로 하나하나 살포시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반향이 아주 크진 않았지만, 지난해 여름 한 달 사이로 발표된 두 장의 앨범 [신인류]와 [Pop]을 보라. 이보다 더 의문점 없는, 구분점이 확실한 작품들이 또 있을까. 3년 전, 오혁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 [Lucky You!]에 이어 안다(Anda)와 함께한 두 번째 프로젝트라는 [Do worry Be happy]도 썩 괜찮았다. 그 자신에게도 굴레 아닌 굴레였을지 모를 어반함에서 벗어나 신스팝적으로 접근하며 상쾌한 톤을 단출하게 꾸린 것처럼 보였다. 그중에서도 타이틀곡 "Dressroom"을 들을 때, 곰탕 한 그릇 비우고 계산하며 문 박하사탕, 이어 가게 밖을 나와 불을 붙인 멘솔맛 담배마냥 시원쌉싸름해 가장 기분이 좋았다. 몇 주 뒤에 있을 2주간의 유럽여행 때도 프랑크푸르트에서 파리, 파리에서 브뤼셀, 브뤼셀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옮겨 다니는 기차 안에서 틀어봐야겠다. - Melo
Tinashe (Feat. Little Dragon) - Stuck With Me
소문만 무성하고 발매가 이리저리 늦추어졌다. 그러다 몇 장의 싱글 발매 후 얼마 전 티나셰(Tinashe)의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 [Joyride]가 마침내 공개되었다. 앨범은 매끈하다 못해 특별한 장점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티나셰라는 아티스트만의 색이 옅었지만, 다행히 몇 곡이 귀에 달라붙어 썩 괜찮은 인상을 남겼다. “Stuck With Me”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든 트랙이다. 스웨덴 출신의 일렉트로닉 밴드 리틀 드래곤(Little Dragon)과의 협업이 조금 뜬금없는 것 같으면서도 유키미 나가노(Yukimi Nagano)와 티나셰의 보컬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며 곡에 녹아드는 게 흥미롭다. 리틀 드래곤이 꿈에 그리던 콜라보레이션 아티스트 중 하나였다고 하니 그에겐 더욱 뜻깊은 트랙이었을 것이다. 앨범으로 보면 오래 기다린 만큼 아쉬움이 컸으나, 불안하지만 노력하는 티나셰의 모습만큼은 요즘 들어 특히나 막막하고 불안정한 나에게 위로가 된다. 그의 행보를 열렬히 응원한다. - snobbi
Buddy (Feat. A$AP Ferg) – Black
버디(Buddy)의 음악은 전부 밝고, 통통 튀고, 여유로울 줄만 알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공개한 두 장의 EP [Ocean & Montana]와 [Magnolia] 모두 비교적 다채로운 사운드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프로듀서 케이트라나다(Kaytranada)의 비트 위에서 신난 듯 랩 스킬을 뽐내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활기차고 신선한 느낌과 ‘버디’라는 랩 네임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나의 기억 속 밝게만 남아있던 그가 한없이 어둡게 돌아왔다. 착하기만 하던 친구가 갑자기 날카로운 발톱을 꺼낸 느낌이다. 버디는 자신의 피부, 생각, 주변 모든 것이 검다고 외친다. 검은 후드를 쓴 채로 인종차별로 사망한 트레이본 마틴(Trayvon Martin)을 언급하고, 경찰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다. 전체적인 프로덕션 역시 가사만큼이나 어둡다. 그 몇 달 사이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 잘은 모르겠지만, 어두워진 버디의 모습도 꽤 마음에 든다. ‘이게 진짜 블랙뮤직이지’ 같은 단순한 생각도 들고. - Urban hippie
Tom Misch (Feat. GoldLink) - Lost In Paris
제이 딜라(J Dilla), 2000년대 네오소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주목하는 아티스트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movie”라는 곡을 좋게 들어서 기억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작 [Geography]로 찾아와 반가웠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결을 따라 각 곡이 잘 이어지는 앨범이다. 수록곡 중 하나인 "Lost In Paris"를 소개해본다. 제목부터 뻔해 보여 심심하다 싶다가도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연주 파트와 골드링크(GoldLink)의 랩이 재미를 더한다. 역시 탐 미쉬(Tom Misch)의 음악은 제이 딜라 스타일의 비트에 다양한 악기 연주가 더해지는 게 매력이다. 계속해서 베드룸 스튜디오(Bedroom Studio)라 부르고 침실이라 읽는 공간에서 음악을 만든다는데, 그래서인지 "Lost In Paris"를 포함해 이번 앨범에도 신선하고 꿈결같은 음악들이 넘실댄다.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도 그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JANE
Robert Glasper Experiment - Day To Day (KAYTRANADA Remix)
케이트라나다(Kaytranada)에 대한 나의 기억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t All"이라는 트랙의 뮤직비디오를 우연히 봣었다. 기묘한 음악적 배열과 색다른 뮤직비디오의 구성에 매료되어 그의 이름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아뒀었다. 2년쯤 지났을까, 케이트라나다는 여전히 그 특유의 리듬 패턴과 찐득한 베이스를 질 스캇(Jill Scott)이나 티드라 모세스(Teedra Moses)와 같은 소울풀한 보컬들과 잘 섞어 그만의 세계를 좀 더 탄탄하게 완성해가고 있었다. 이후, 사운드클라우드 시장을 바탕으로 리믹스 강자로서 입지를 세움과 동시에 관객이 얽힌 코믹한 해프닝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또, 보일러 룸(Boiler Room) DJ 셋 영상은 몬트리올 출신의 프로듀서이자 DJ인 그를 더 대중적으로 알리는 계기였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로버트 글래스퍼(Robert Glasper)와의 작업물을 세상에 내놨다. 잔뼈 굵은 프로듀서이자 피아니스트인 로버트 글래스퍼와 그의 밴드 로버트 글래스퍼 익스페리먼트(Robert Glasper Experiment)의 음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해낸 EP [The Artsciences Remixes]다. 곳곳에 탈립 콸리(Talib Kweli), 알렉스 아일리(Alex Isley) 등이 참여했으니 참고. 여덟 트랙이니 시험 기간에 가볍게 듣기 좋고, 또 로버트 글래스퍼의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기도 하니 체크해보도록 하자. - Kimioman
글 | 힙합엘이 매거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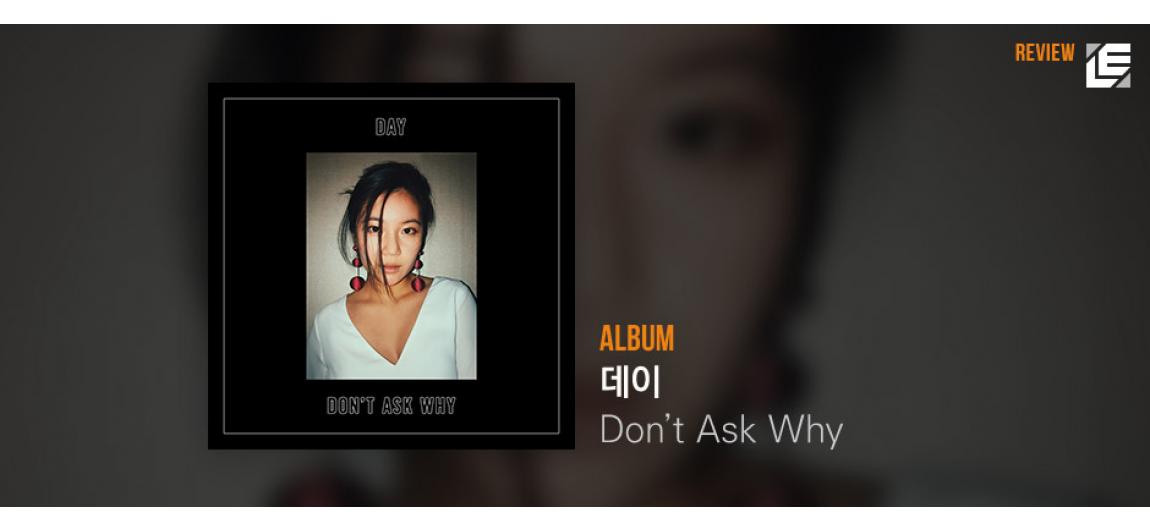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