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9일, 나플라(nafla)는 비즐라 매거진(VISLA Magazine)과 인터뷰를 진행했었다. 당시 인터뷰 서문에는 나플라를 두고 ‘LA에서 온 혜성 같은 신인’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 그로부터 약 반 년 후가 지난 현재, 나플라는 더는 ‘혜성 같은 신인’은 아니다. 그의 음악에 많은 이가 익숙해졌을 거고, 그가 서울에서 보낸 시간도 꽤 흘렀다. 나플라 또한 이 점을 분명 알고 있을 터. 그렇기에 첫 번째 정규 음반 [ANGELS]를 두고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 싶었다. ‘랩을 보여주고 싶어서 화가 났다’던 그가 정규 음반에서는 어떤 면모를 보여줬는지, 나플라에게 LA와 서울, 두 도시는 어떤 느낌으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ANGELS]라는 앨범엔 어떤 더 자세한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한 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나플라는 천천히 이야기를 끌어냈다.
LE: 간단하게 힙합엘이 회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N: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정규 앨범을 들고 온 LA에서 온 나플라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하려고 하는 신인 래퍼입니다.
LE: 신인 래퍼라고 하기에는 활동한 지가 벌써 좀 되지 않았나요? (웃음)
사실 그렇긴 하죠. 그래도 조금 더 알려야죠. 아직 대중적으로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LE: 앞서 말씀하신 ‘LA에서 온’이라는 수식어도 이제는 조금 어색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붙여서. (전원 웃음) 사실 힙합엘이나 다른 매체에서는 이 수식어가 뻔하고 식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대중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 수식어가 나플라를 잘 나타내는 단어 같아요. 그리고 <쇼미더머니>로 인해서 워낙 여러 해외파 아티스트들이 한국으로 왔잖아요. 자연스럽게 저도 그 한 무리인 것 같아요.
LE: 과거 비즐라 매거진 인터뷰에서는 ‘서울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요즘은 서울 환경에 좀 익숙해지셨나요?
네. 지금은 지하철 잘 타요. (전원 웃음) 그런데 아직도 택시 기사님이 ‘올림픽대로로 탈까요?’, ‘무슨 대로로 탈까요?’ 물으시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작업실 근처나 공연을 많이 하는 홍대, 이태원, 강남 쪽은 조금 아는데, 전체적인 도로나 길은 아직 익숙하지 않죠. 그래도 당연히 예전보다 적응은 잘 하고 있어요.
LE: 이제는 심적으로 서울과 익숙해졌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오히려 요즘은 미국에 갈 때 느낌이 달라요. ‘아, 미국이 이랬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옛날에는 미국이라는 곳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늘이나 풍경을 봐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와, 너무 예쁘다’, ‘진짜 내가 좋은데 살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껴요.

LE: 최근 활동을 먼저 얘기해보면, 재미있는 피처링 작업이 좀 있었어요. 헤이즈(Heize) 씨, 헨리(Henry) 씨, 키비(Kebee) 씨 등과 작업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외부 작업을 진행했는지 궁금해요.
일단 피처링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저 자체를 상품화하는 거니까, 소비성 면에서 타이밍을 많이 신경 쓰죠. 어떻게 하면 다른 시장에 내 이름을 알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시장에서 계속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많이 신경 썼어요.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시기나,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고려하는 것 같아요.
LE: 피처링 제의는 아직도 많이 오고 있나요?
옛날에는 피처링 제의가 많았는데, 제가 거절을 많이 한다는 게 퍼졌는지 요즘은 또 별로 없어요. (전원 웃음)
LE: 루피(Loopy) 씨와 함께 서태지 씨의 “인터넷 전쟁”을 리메이크한 작업도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감회가 남다른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서태지 씨가 저희를 직접 선택했다는 면에서 ‘계속 지켜봐 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 이 정도면 ‘엄마, 아빠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태지니까. (웃음) 그리고 제가 서태지 씨 음악을 예전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에게 음악적으로나 스타일적으로 영감을 많이 줬죠. 그래서 같이 작업하자고 하셔서 리메이크든, 뭐든 일단 OK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태지 씨 5집을 좋아해요. 5집을 작년에도 많이 들었고, 원래는 6집도 좋아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서태지 씨 캐릭터가 개 멋있잖아요. 또,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더 끌리는 게 있었죠. 저는 아직도 그때의 서태지를 제일 좋아해요. 마치 사람이 불같았죠. 그래서 “인터넷 전쟁”을 리메이크하자고 하셔서 기쁜 마음이 컸어요. 물론, ‘와 이거를 어떻게 이기지?’, ‘개빡센데?’ 이런 부담감도 당연히 있었죠. (웃음)
LE: 서태지 씨 공연의 게스트도 하셨잖아요.
공연도 확실히 남달랐어요. 특히, 사운드 케어가 엄청났어요. ‘나도 이러면 맨날 공연하겠다’ 싶을 정도로 사운드의 퀄리티가 좋았죠. ‘비용 투자를 소리 쪽에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LE: 사실 “인터넷 전쟁”의 경우는 나플라 씨가 기존에 냈던 음악과는 타켓층이 많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반응적인 차이도 있었을 거 같은데요.
확실히 타켓층이 다르다 보니까, “인터넷 전쟁”을 작업한 걸 힙합 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서태지 씨 팬분들은 ‘대견하다’, ‘우쭈주’ 이런 식으로 많이 봐주시더라구요. (전원 웃음) ‘이 곡을 다르게 해석해서 보기 좋네요’ 이런 식으로 쓰담 쓰담 해주는 기분이었어요. (웃음) 공연도 마찬가지였죠. 소리 지르면서 손 흔들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어이구 잘하네’ 막 이런 느낌. (웃음) 공연 연령층도 당연히 30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를 생판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죠.
LE: 이제는 앨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일단 나플라 씨가 술을 많이 마시거나 거나하게 놀기를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new blood] 때부터 꾸준하게 이번 정규 앨범을 준비해 온 건가요?
일단 앨범의 방향성을 생각하기 전부터 곡 작업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거의 한 20곡은 버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일 년 동안 곡을 많이 쓰고, 비슷한 풍으로 분위기를 맞춰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음악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걸 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못했거나, 사람들이 저에게 바라는 것들도 귀담아들어서 조금 더 작업했던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이 놀지는 않았고, 항상 작업하는 대로 진행했죠.

LE: 우선, 간단하게 이번 앨범 [ANGELS]에 관해서 직접 소개해주세요. PR 시간입니다. (웃음)
[ANGELS]는 일단 저의 첫 정규이자 옛날 [THIS & THAT] 믹스테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보겠다는 생각으로 방향을 잡은 앨범이에요. 그런데 또 붐뱁 스타일을 하다 보면 이미지가 뻔하잖아요. 제가 그런 걸 워낙 기존에 많이 해오기도 했고, 요즘 한국에서 붐뱁이 다시 유행되면서 많은 래퍼들이 그 느낌을 다루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기준점을 조금 달리했어요. 2000년대의 미국 힙합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죠.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를 표현했던 한국 아티스트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기가 조금 건너 뛰어진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티페인(T-Pain), 릴 웨인(Lil Wayne), 칸예 웨스트(Kanye West), 50 센트(50 Cent) 등이 중간에 있었는데, 그 느낌이 사라지고 바로 뉴스쿨의 시대가 온 느낌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느낌을 좀 알려주고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대한 당시의 느낌을 살리고자 해서 그런 풍의 곡들을 앨범에 넣었죠.
LE: 이번 앨범이 당연히 정규작이다 보니 EP나 싱글을 작업했을 때보다 마인드 셋이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마인드 셋이 당연히 달랐죠. 일단 부담감이 제일 컸어요. 저는 부담감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정규 1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니까. (웃음) 그래도 최대한 그런 부담감을 덜어내고자 했어요. 일단은 계속 작업물을 뽑아서, 비슷한 풍으로 여러 곡을 모으는 게 중요했어요. 앨범의 전체적인 과정에도 많이 참여했죠. 음악 퀄리티적으로 어떤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누구에게 믹싱을 맡기고, 마스터링을 어디서 하고, 앨범을 발표하고 난 이후 나의 이미지가 어떨지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전작에서는 음악적인 플로우나 리듬에 대한 디테일에 조금 더 신경 썼다면, 이번에는 그 외의 아웃풋 역시 많이 신경 썼어요. 커버나 자켓 사진 등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인 아웃소싱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LE: 실제로 믹싱, 마스터링 등 앨범 프로듀싱에 많은 부분을 담당해서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전체적인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나요?
이번에 매튜 심(Matthew Sim)이라는 믹싱 엔지니어분께서 앨범의 반 정도를 맡아주셨어요. 빅 션(Big Sean), 구찌 메인(Gucci Mane), 디자이너(Designer), 푸샤티(Pusha T) 같은 해외 아티스트들 곡을 많이 맡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마스터키(Masterkey) 씨가 나머지 반을 맡아주셨고, Y-8이라는 소리에 정말 민감하고 잘하는 믹싱 엔지니어까지, 이렇게 총 세 분이 저와 같이 작업했어요. 마스터링은 데이빗 보위(David Bowie), 런 더 쥬얼스(Run the Jewels), 영 떡(Young Thug), 위켄드(The Weeknd) 같은 해외 뮤지션과의 작업을 많이 해오신 조 라폴타(Joe Laporta)라는 분과 진행했죠. 확실히 이번 앨범에서 제가 해외적인 소리를 잡고 싶어서 조금 더 해외 엔지니어 쪽과 작업을 많이 한 거 같아요.
LE: 덧붙여서 앨범 커버에 관한 이야기도 풀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미스터 미상(Mr. Misang) 씨라는 분과 작업했는데요. 제가 일단 앨범 커버를 그림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죠. 일단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 밖에서 온 사람의 이미지를 주고 싶었어요. 그게 저니까. 그런 느낌을 조금 더 만화적으로 재미있게 풀려고 했죠. 저는 모든 면에서 콜라 같은 느낌을 원했어요. 남녀노소 모두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느낌.
LE: 사실 요즘 한국에서는 정규 앨범을 찾아보는 게 아주 흔한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보다 짧은 규모의 EP, 미니 앨범이나 싱글을 많이 내는 추세인데, EP 한 장 다음으로 바로 정규 앨범을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정규 앨범을 정말 가지고 싶었어요. 정규 1집이 있어야 조금 더 제 커리어가 오피셜해지는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느낌을 떼어놓고도 그냥 정규 작품에 대한 욕심도 컸어요. 일단 1집은 꼭 내고 다른 작업을 하고 싶었죠.
LE: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왜 제목이 [ANGELS]인가요? 많은 분들이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를 생각할 것 같은데, 다른 중의적인 의미도 있을까요?
사실 맨 처음의 가제는 ‘Concrete Blessing’이었어요. ‘콘크리트 위에 내린 축복’이라는 느낌이었죠. 원래는 이 타이틀을 쓰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외우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웃음) 그래서 다른 짧은 단어를 생각해봤죠. 그러다 ‘축복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Angels’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로스앤젤레스와도 연관이 있죠.
LE: ‘콘크리트 위에 내린 축복’이라면 의미상, 콘크리트가 ‘서울’이고, 축복이 ‘LA에서 온’이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내가 축복을 준다’, ‘다른 음악을 주겠다’ 이런 의미를 담았어요.
LE: 항상 궁금한 부분이 이었는데요. 이번 앨범 트랙 명도 그렇고, 평소에 소문자로 이름이나 제목 등 표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소문자를 좋아해요. (웃음) 소문자가 시각적으로 더 마음에 들어서 그냥 표기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별 의미는 없어요. (웃음)
LE: 곡 제목을 하나하나 보면, 딱히 어떤 의도가 있는 채로 제목을 지었다기보다는 본능적으로 그 트랙이 풍기는 음악적 분위기라든가, 직관적으로 바로 꽂히는 단어에서 캐치해서 타이틀을 지은 것만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김박첼라(KIMPARKCHELLA) 씨한테 비트를 받은 “Dead Tree”라는 곡이 있는데, 그게 처음 비트를 받았을 때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업을 다 하고 곡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보고 했는데, 입에 잘 안 붙더라구요. (웃음)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쓴 곡들이 많아요. 대부분 제가 산 비트의 가제나 처음 받은 비트의 이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대체로 곡 타이틀이 짧고 기억하기 쉬운 게 많아요. 다행히 전체적인 앨범의 느낌과 타이틀이 서로 어색하지 않은 거 같아요.
LE: 이번 앨범은 화성적으로 여러 무드의 음악이 실려 있어요. 특별히 어떠한 시대상이나 특정 장르를 목표하지는 않는 거 같은데, 나플라라는 래퍼에게 영향을 미친 음악의 연대기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특정 장르를 원해서 작업하지는 않았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THIS & THAT]의 업그레이드판을 원했죠. [THIS & THAT]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둡고 세게 랩하는 트랙도 있고, “멀쩡해”처럼 LA풍의 칠한 느낌의 곡도 있어요. “Medusa” 같은 붐뱁 트랙도 있죠. 정규 1집에서는 이것저것이라는 뜻의 [THIS & THAT]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또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여러 장르를 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웃음) 한 장르에 꽂힌 느낌보다는 여러 가지를 다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LE: 앞서 2000년대의 미국 힙합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유행을 거의 포기한다’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의 걱정이나 나름의 해결책은 없었나요?
일단 “fly high (M&H)”라는 곡이 거의 이번 앨범의 시작점이었어요. 그 곡을 만들 당시가 제가 2000년대 힙합에 제대로 꽂혀있던 시기였고, 그렇게 그 프로젝트가 지금으로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 유행이나 성공보다는 제 욕심이 가장 중요했어요. 정규 1집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마음에 들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뭐, 걱정하기에는 아직 시간 많으니까. (웃음) 잘 되면 당연히 좋지만, 안 돼도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LE: 팬들은 나플라 씨에게 화려하고 몰아붙이는 랩, 화가 난 랩을 많이 기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면, 이번 음반에서는 화려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곡을 만드는 데에 노력하신 거 같아요.
아티스트가 많잖아요. 플로우를 정박에 박는 사람도 있고, 박자를 조져버리는 사람도 있구요. 저는 정규 앨범이니 곡을 만들고 싶었던 게 제일 컸어요. 사람들이 공연할 때 더블링을 치거나, 따라 부르기 편한 곡이요. 랩을 아무리 잘해도, 예를 들면 켄드릭 라마(Kendrick Lamar) “Rigamortis”를 들으면 좋긴 한데, 제가 따라 부르는 재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Bitch, Don’t Kill My Vibe” 같은 게 따라 부르기에 더 즐겁구요.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더 하면서 만든 것도 있는 듯해요. 화려한 것도 좋지만, 화려하면서도 최대한 따라 하기 쉽게 했던 거 같아요. 칸예 웨스트가 그 두 가지를 되게 잘해서 많이 참고했구요.
LE: 화려한 랩을 좋아하는 팬들이 원하는 ‘화난 나플라’와 본인이 원하는 그림 사이의 간극은 어떤 식으로 맞췄나요?
[new blood]는 당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믹싱/마스터링도 욕심이 나서 직접 한 거구요. 오히려 이번 음반이 맞춤형으로 피드백도 많이 받으면서 만들었어요. 가사에서도 리스너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은 한국어를 좀 더 쓰고, 다른 뭔가를 좀 더 보여주고 싶은 곡에서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구요. 팬들이 바라는 것과 제가 하고 싶은 것 사이의 균형을 최대한 잡은 거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문제인데, 많은 것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 모았죠.
LE: 그런 이유에선지 몰라도, ‘LA의 나플라’와 ‘서울의 나플라’로 구분한다면, 후자의 색이 좀 강했던 거 같아요.
앨범의 흐름을 보면 음악이 미국풍에서 한국풍으로 바뀌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변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도 항상 미국과 한국의 음악을 다르게 생각해요. 듣는 게 다르니까요. 요즘엔 미국에 없으니 미국에서 어떤 걸 듣는지 알기가 더 어려워요. 미국에 있던 때를 기억한다든지, 다시 다녀온다든지 하며 만든 걸 앞에 배치했고, 뒤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든지 그럴 때 만들었어요. 소주와 담배가 한국 바이브인 거 같거든요. 그런 느낌에 어울리는 비트가 뒷면에 있죠. 풍이 좀 더 외로워요. 그게 제 상황이고, 그걸 표현한 게 서울인 거 같아요.
LE: 중간마다 스킷이 들어가 있어요. 음반 전체 구성에서 분기점의 역할을 하는 듯해요.
곡을 만들어놓고 흐름 정리를 할 때 스킷이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스킷으로 재미있는 포인트를 주고 싶었어요. 옛날에 다이나믹듀오(Dynamic Duo)가 그런 걸 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흐름에 기반을 두고 만든 거 같아요. 음반 자체가 스킷을 기준으로 삼등분으로 나뉘는 기분이 들어요.
LE: 스킷을 일어날 때, 친구와 전화할 때, 택시 안 등의 상황을 설정한 이유는 뭔가요?
[ANEGELS]에는 저 나름의 스토리가 있어요. “wake up”은 아침이 아닌, 파티에서 뻗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공연하다가, 세 번째 중간에 ‘야, 택시 불렀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이야기를 하구요. 한국에서의 제 삶인 거죠. 놀다가 헤어지고, 블루(Bloo)와 같이 사니까 택시를 타고 가다가 허무해진 느낌을 받아서, 그걸 서울이라고 풀었죠.

LE: 지금까지는 앨범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봤다면, 이제는 좀 더 트랙 바이 트랙으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첫 곡 “jungle”은 의도적으로 드럼 파트로만 비트를 구성했단 느낌이 들었어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싶었던 거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처음부터 로우(Raw)한 사운드, 드럼과 랩으로만 할 수 있는 곡으로 임팩트를 주면 좋을 거 같았어요. 한국을 ‘콘크리트 정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입성하는 느낌으로 쓰면 좋을 거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비트를 들었을 때 저를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작업을 했구요. 들어보면 드럼이 가지고 노는 패턴 같은 게 되게 재밌어요. 그걸 들려주고 싶어서 끝에 드럼을 조금 남겨놓았구요.
LE: “fly high (M&H)”에서는 2000년대 중반쯤 칸예 웨스트의 색깔이 엿보여요.
비트도 그런 색을 찾았구요. 앞으로 나올 뮤직비디오에 입은 옷도 칸예 웨스트를 패러디했어요. 그때 2000년대 칸예 웨스트를 그때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플로우 배치 같은 것도 비슷하게 해보려고 했죠. 주변에 ‘너무 칸예 같지 않아?’라고 많이 물어볼 정도였어요. 아니라고들 해서 다행이긴 한데요. (웃음) 어떻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제 색깔과 섞으려고 했고, 잘 입혀졌으면 좋겠어요.
LE: “kickback”은 조금 레이드백된, LA 바이브의 음악이 아닌가 싶더라구요.
클라우디 비트(Cloudy Beats)라는 프로듀서가 만든 곡인데요. 그분이 곡을 보내셨을 때 제목이 ‘LA’였어요. 한국인이 바라본 LA는 이런 풍인가 싶었죠. LA라고 쓰여있으니까 저에게도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바로 들어봤더니 일단 좋았고, 쓰고 싶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Kickback’은 하우스 파티 같은 걸 할 때 쓰는 느낌의 단어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도 맥주 챙겨가서 친구 집에서 마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을 테마로 잡았어요. 저도 그렇게 느낀 적이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 ‘맨 왼쪽을 위해 준비한 trojans’라는 가사가 2절에 등장하는데 그런 진솔한 얘기? 진솔한 건 아닌가? 아무튼, 풍 자체는 그런 곳에서 틀기 좋은 음악이길 원했어요. 센 음악이기보다는 틀어놓고 얘기하다가도, 들을 때 리듬을 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요.
LE: “kickback”에서 ‘한국인이 바라본 LA는 이렇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나플라 씨가 느끼기에 LA를 잘 그린 곡은 어떤 곡인가요?
캘리포니아를 느끼려면 제 곡 중 “loosies”를 들어보면 돼요. 더 느려요. 한국이 워낙 일하기 바쁘다 보니, “kickback”은 bpm이 조금 더 빠른데요. 그래서 “loosies”가 제가 느끼는 캘리포니아에 좀 더 가까워요.
LE: “jail”은 드렁큰 타이거(Drunken Tiger) 씨의 초창기 음악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인트로가 비슷해서인지도 모르겠네요. 옛날 한국힙합을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묻어나는 걸까요?
소울 컴퍼니(Soul Company), 허니 패밀리(Honey Family) 같은 집단을 좋아했으니까요. 요즘에도 바스코(Vasco) “첫느낌”, 더콰이엇(The Quiett) “상자 속 젊음” 같은 걸 들어요. 자연스럽게 묻어난 거 같아요. 제가 목소리를 좀 높이면 드렁큰 타이거 씨가 주는 느낌이랑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전 그렇게 느껴요.
LE: LA에 계실 때 한국힙합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한국힙합의 느낌은 어땠나요?
그땐 어렸고, 어떤 의미로는 영어도 잘 못 했어요. 한국 가사가 더 이해가 잘 갔어요. 그러다 보니 플로우 배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가사를 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위주로 음악을 들었고, 그러면서 한국힙합만 듣게 된 거 같아요. 당시 미국 힙합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미국 힙합의 매력을 잘 몰랐어요. 6학년 때 피아노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투팍(2Pac)의 “California Love”를 들려주셨는데 별로였어요. 오히려 “Changes”나 “Life Goes On” 같은 서정적인 곡이 좋았어요.
LE: 인터뷰를 보니, 우탱클랜(Wu Tang Clan)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근데 “deadtree”는 또 우탱클랜의 느낌과 비슷한 거 같단 말이죠.
별로 안 좋아해요. (웃음) 근데 말씀하신 것과 반대예요. “jail”에서 오히려 이스트 코스트 힙합의 느낌을 담으려고 했어요. “deadtree”는 더 뒤로 가서, N.W.A. 같은 느낌을 참고했어요. 더 옛날의 웨스트 코스트 힙합을 하고 싶었던 거죠. ‘it's west coast bla blocka’ 같은 가사가 그렇잖아요. 비트를 처음 들었을 때 그렇게 하면 재미있을 거 같았어요. 랩을 좀 더 통통 튀게 하는 거죠.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비트 자체가 서태지 씨의 “하여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 만들고 나서는 한국힙합과 웨스트 코스트 힙합의 콜라보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지도 않을까 싶었어요.
LE: 그간 인하우스 프로듀서와 주로 곡을 만드셨잖아요. 이번 음반은 확실히 프로듀서진이 다양해졌어요. 김박첼라, 클라우드 비츠, 간 보흐(Gan Vogh) 씨 등이 함께했어요.
저는 뱉어지는 곡을 모아요. 그래서 안 나온 곡도 많죠. 곡을 준 사람들은 왜 안 나오냐고 하는데 좀 기다려달라고 해요. 사실 “been”이 다 만들었는데, 비트가 팔려서 오피셜하게 못 낸 곡이거든요. 그걸 방지하고자 곡이 잘 나올 거 같다 싶으면 일단 다 사놔요. 메킷레인 레코즈(MKITRAIN Records, 이하 메킷레인) 측으로 프로듀서들 곡이 엄청 많이 와요. 전 그걸 다 들어요. 주변에 프로듀서가 얼마 없기도 하고, 저만의 프로듀서도 없구요. 제가 추구하는 음악이 뭔지 모르다 보니 음악을 들을 때마다 기분도 다르구요. 그래서 일단은 들으면서 다 퍼오는 거 같아요.
LE: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1 MC, 1 프로듀서 같은 형식은 크게 흥미가 없으실 거 같아요.
그게 편하긴 하죠. 프로듀서가 한 명이면 느낌이 비슷하니 음반 만들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해보고 싶지만, 같이 하고 싶은 프로듀서가 아직은 없는 거 같아요.
LE: 크레딧을 보니 샘플 클리어런스를 거진 다 하신 거 같더라구요.
샘플 클리어 관련해서 다 물어봤어요. 근데 회사가 망했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하기도 했어요. 어떤 프로듀서는 답이 없구요. 가능한 방법은 다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사용한 샘플을 다 적어놨어요.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라구요. 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연락을 안 받으니까.
LE: 주변에 프로듀서가 얼마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프로듀서진이 래퍼 피처링진보다 다양한 거 같아요. 사실 이번에는 다른 래퍼분들도 참여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늘상 하던 대로일 수도 있지만, 이번 앨범 피처링에 메킷레인 멤버분들만 참여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 제 기준에서는 메킷레인을 제일 디테일하게 아니까 듣다 보면 멤버들 목소리가 떠올라요. 무의식적으로 항상 먼저 생각나요. 그중에서도 이번 앨범에는 붐뱁적인 사운드가 많다 보니 영 웨스트(Young West)가 생각이 많이 안 났어요. 오히려 [new blood] 때 많이 했죠. 곡마다 누구를 어떻게 넣어야겠다고 한다기보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생각나면 같이 하는 타입이라서 지금처럼 진행이 됐구요. 다른 아티스트와의 작업은,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정규 1집은 좀 깔끔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인 거죠. 어떤 제 소장품으로 만들고서 그다음에 하고 싶은 거죠. 플랜은 많이 짜고 있어요.

LE: “gra gra”는 웅장하고 맥시멀한 게 저스트 블레이즈(Just Blaze) 느낌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수록곡 중에서 가장 강세가 센 편이다 싶더라구요.
딱 예전 할렘, 뉴욕이죠. 일단 비트는 제가 2000년대를 좋아하니까 앨범에 넣고 싶었구요. 그 트랙이 “friends” 스킷 다음에 있어요. 그에 연장선으로 두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 스킷도 들어보면 두 명의 친구로 나뉘어요. 그게 “gra gra”와 “loosies”로 나뉘는 거죠. 그중에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센 비트가 필요하지 않나 싶었어요. 뭔가 더 있어야 할 것만 같아서 마지막까지 건든 곡이기도 해요. 원래는 “deadtree”를 스킷 다음에 넣었는데, 약간 미스가 있어서 “gra gra”를 끝까지 붙들고 작업했어요.
LE: 스킷에서 뜰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던 친구는 가짜 친구인가요? 혹시 실화에서 모티브를 따신…? (웃음)
가짜 친구인 건 맞는데, 실화까진 아니고 그냥 저의 상황을 표현한 거죠. 연락 안 오던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고, 나도 뜨고 싶다면서 피처링 좀 해달라고 하고, 안 해주면 너 변했다고 하고. 제가 피처링한다고 뜨는 것도 아닌데. 한국에 와서, 조금 더 올라가면서 그런 친구적인 면에서 일이 많아질 거 같아요. 아무튼, 스킷은 그 부분에서 모티브를 따서 만든 거고, 녹음은 잘 소화할 2세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그 친구한테 부탁했었어요.
LE: 이제 한국힙합 씬에 녹아든 지 대략 2년쯤 되어가잖아요. 워낙 처음부터 하입 받았으니까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씬에서 이래저래 더럽다면 더러운 일도 있었을 거 같고, 또 필요 이상으로 욕먹을 때도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했고, 더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 겸손해진 부분이 엄청 많구요. 다른 아티스트, 특히 위대한 옛날 아티스트들 음악 들으면서 이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놀라면서 더 겸손해지는 거 같아요. 안 좋은 것들 하면 악플 같은 게 있을 텐데, 저는 최대한 안 읽고 무시하는 편이에요. 사람인지라 아무리 칭찬이 많아도 나쁜 말 하나가 있으면 그게 더 신경 쓰이더라구요. 이 일을 제가 선택은 했으니까 이런 말들을 다 못 받아들일 거면 차라리 보질 말자고 생각하고 있어요.
LE: 대중, 힙합 팬들의 리액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음악을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 전과 후로 달라졌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좀 더 세게 다가오죠. 피드백이라고 느껴지니까요. 이 사람이 음악을 얼마나 알든, 저를 얼마나 알든지는 상관없어요. 글로 보면 모든 게 다 똑같이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LE: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원래 성격이 되게 태연하실 거 같아요.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별로 신경 안 쓰시고.
표현을 많이 안 해요. 표정 변화도 별로 없구요. 근데 제가 삭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진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LE: “사과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과상자에 돈을 넣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한국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키워드를 어떻게 떠올리셨고, 그걸 또 아예 메인 테마로 써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맨 처음에 녹음을 따다가 이건 타이틀이다 싶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사과상자에 담아 돈다발”이라는 라인을 썼는데, 믹싱하시는 분께서 이걸 좀 더 각인시켜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따라 부르기도 좋을 거 같아서 아예 그렇게 가버리자 해서 편곡을 많이 하고 지금의 버전이 됐어요. 그리고 사과상자가… 그게 한국의 갱스터 Shit인 거 같아요. 그건 한국밖에 안 하잖아요. 저는 무슨 느와르 영화 보다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LE: 사과 상자에 5 만원짜리를 꽉꽉 담으면 1억이라던데…
와, 그걸 미리 알아 놓을걸. (전원 웃음)
LE: “호피 (dime)”라는 트랙 얘기를 좀 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빈티지한, 90년대식의 이성을 꼬시는 노래 같다 싶기도 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호피 무늬 옷을 입고 단발머리를 한 여자분 사진을 봤었어요. 예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썼던 거 같아요. (웃음) 그 분을 클럽에서 봤으면 어땠을까도 생각해봤구요. 그 곡에서도 티가 날 거예요. 메이스(Mase)의 라인을 아예 갖다 썼거든요. 톤을 다운시킨 것도 메이스의 쿨한 느낌을 가져간 거였어요. 이번 앨범에 어떻게 보면 미국 힙합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제 식으로, 한국식으로 변형해서 보여주려 한 의도가 다분히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간지 있는 아티스트들의 스타일에 최대한 제 색을 입히는 거죠. “호피 (dime)”도 그런 곡 중 하나인 거죠.
LE: “호피 (dime)”는 싱글로도 미리 공개됐었잖아요. “jail”도 그렇구요. 아무래도 가장 다가가기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지 싶어요.
두 곡이 풍이 정반대니까 ‘이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것도 있나 보네?’라고 생각하게끔 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 같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가가기 쉽다는 점이 제일 컸던 거 같아요. 루피 형한테 “호피 (dime)”를 들려줬을 때, 뷔페 같은 데서 접시에 음식 담으면서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전체이용가 같은 느낌이 난다고.
LE: 가사를 보면 전체이용가가 아닌 거 같던데요? (웃음) 뷔페에서는 다들 가사를 안 듣긴 하지만요. 아무튼, “kickback”과도 맥락이 비슷한 곡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냥 BGM으로도 쓰일 수 있고, 춤을 추는 용도로 쓰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음악을 이번 앨범에서 많이 하려고 했어요. “혼자가 편해”도 그렇구요. 최대한 흘러나오는 음악을 넣고 싶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좋은 음악들이 그런 거 같아서요. 라디오에서 뭐가 나올 때, ‘들어보자.’ 하고 듣지 않잖아요. 얘기하다가 듣고, 그러다 구절 몇 개가 꽂히고. 그런 식으로 편안함으로 주려고 했던 거 같아요.

LE: 말씀하신 “혼자가 편해”는 가사가 자기 고백적인 느낌도 있는 거 같아서 2000년대 중반의 한국힙합 같다 싶더라구요. 그게 나플라 씨가 그간 래퍼로서 보여주신 모습과는 결이 다른 거 같기도 하구요.
그냥 진솔한 얘기를 쓰려 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음악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오왼 오바도즈(Owen Ovadoz) 형도 네가 내 신발을 신어봐야 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좀 더 길게 풀었던 거죠. ‘내 신발은 이래. 신어볼 거야?’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같아요.
LE: 나플라 씨는 혼자 계실 때 보통 뭘 하시나요?
전 진짜 혼자 많이 있어요. 컴퓨터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음악 디깅을 되게 많이 해요. 제 학창 시절도 그렇고, 거의 컴퓨터랑 살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혼자가 항상 좋았어요. 예를 들어, 지금도 스튜디오에 가면 방에 혼자 있어도 밖에서 직원이 일한다든지, 다른 방에서 누가 작업하고 있다든지 하면 진짜 혼자는 아니잖아요. 한국에 와서는 진짜 완전히 혼자였을 때가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블루랑 같이 살기도 하고, 스튜디오 가면 항상 누가 있고. 그러다 보니 혼자가 편할 때가 그립고 해서 그런 가사를 썼던 거 같아요.
LE: 그럼 그 혼자가 편하다는 감정이 한국, 서울에 와서 더 크게 느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에서는 원래 혼자였으니까. 차도 있고, 음식도 가서 다운로드 받아 놓은 거 뭐 보면서 먹고, 또 작업도 하고, 낮잠 자다 일어나서 ‘어, 이거 루피 형 들려줘야지.’ 싶어서 밤마다 루피 형네 가서 놀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예 없잖아요. 지금은 뭘 작업하면 다 알아요. 블루한테도 ‘이거 들어볼래?’ 하면 ‘어, 들어봤어. 훅 좋더라.’ 하고. (전원 웃음) ‘어…?’ 싶죠. 그런 상황이 많아졌어요.
LE: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작업에 방해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LA에서 혼자 작업할 때랑 느낌이 사뭇 다를 거 같기도 해요.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낮에 작업하다가 지금은 좀 더 일찍, 아침에 해요. 다들 밤에 작업을 많이 해서 다들 자고, 진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작업해요. 어떻게 보면 계속 적응하는 단계인 거죠.
LE: 조금 민감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럼 작업실을 혼자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금 같이 있는 작업실에서 나오실 건가요?
전 여건이 된다면 미국에 가서 작업하고 싶어요. (전원 웃음)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루피 형도 새벽에 스튜디오에 가면 다들 깨있다 보니까 집에서 작업하는 거 같아요. 작업할 때는 다들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
LE: 지금 블루 씨랑 같이 살고 계시고, 가족분들과는 떨어져 계신 거죠?
어머니, 아버지는 미국에 계시구요. 친가 쪽은 한국에 계시고, 외가 쪽은 미국에 계세요.
LE: “Smile”이란 노래와 연관해서 얘기해보면,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음악가로서 영향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곡을 앨범에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진실된 이야기를 쓰긴 했는데, 나플라라는 뮤지션에게 이런 약한 이미지를 입히면 저한테 다르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정규 1집이니까 최대한 나의 모든 걸 보여주자는 생각이 커서 넣기로 했죠. 아버지가 할머니를 못 뵌 지 엄청 됐으니까 맨날 전화하셔서 할머니 잘 챙겨드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느끼는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가사를 썼던 거 같아요.
LE: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앨범이 뒤로 갈수록 감성적여지는 거 같은데요. 사실 한국에 돌아오셔서 지금까지 한국힙합 씬에서 활동하시고, 한국에서 사시는 동안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당연히 메킷레인 멤버분들일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처음에 멤버들이랑 메킷레인을 결성했을 때랑 2년 여를 함께 보내온 지금, 멤버들이랑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느껴지는지 차이가 좀 있을 거 같아요. 이제는 일종의 프렌드쉽이 더 강해졌을 수도 있을 거 같구요.
지금은 다들 개개인 거를 할 때가 많아진 거 같아요. 조금 더 업데이트되는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는 매일 만났으니까 항상 뭘 하는지 알았는데, 지금은 다들 자기 거 하느라 바빠져서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 성장한 거 같아요. 사람으로서, 어른이 된 기분이 있어요. 생각의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졌죠. 고민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한국은 좀 고민하게끔 하는 곳인 거 같아요. 미국에서의 프렌드쉽은 달라지는 것 없이 똑같은데, 얘기하는 분야라든지, 고민거리가 달라지고, 그 고민에 관해 많이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LE: 앨범이 나왔으니까 나플라 씨는 고민거리 하나를 덜어냈을 거 같은데요.
더 늘었어요.
LE: 어떤 고민인가요?
‘2집은 어떡하지? 단독 공연 어떡하지?’ 그런 게 제일 가까운 고민이죠. 하나 내면 풀릴 줄 알았는데, 해야 할 게 더 많아졌어요.
LE: 그럼 현시점에서 가장 먼 고민은 어떤 건가요? 이런 건 꼭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당장 고민할 건 아닌 일종의 청사진이랄까요?
아, 목표겠죠. ‘그래미를 어떻게 받지? 50살 때 음악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거죠.
LE: 단독 공연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5 Coins>라든가, 미디어를 통해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실 나플라 씨가 작품 활동할 때 빼고는 그렇게 많이 팬분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 거 같기도 한데요. 이번에 [ANGELS]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활동할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최대한 대중분들한테 어프로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랩스킬적으로 현란하진 않더라도 최대한 재치 있게 풀려고 한 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힙합을 아시는 분들한테도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놓치고 싶지도 않아요. 다양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프레쉬하지 않잖아요. 프레쉬하지 않으면 좀 더 성숙해진 진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거 같아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LE: 정리를 좀 해보는 차원에서, [ANGELS]는 본인이든, 팬에게든 어떤 의미를 지닌 음반인가요?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컨셉보다는 제가 지금 누구고, 어디에 있고,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표현했어요. 사진을 찍은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 이 음반을 들어보면 당시 처했던 상황이나 스토리가 기억날 수도 있구요. 팬들에게는 제가 느꼈던 걸, 느끼고 있는 걸 느껴줬으면 했어요. 뒤로 가면서 진솔한 이야기도 있고, 앞에는 ‘옛날 나플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He’s back’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LE: 과거 인터뷰에서 ‘내가 누군지 찾아가는 중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직도 찾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도 저번보다는 좀… 모르겠어요. 엄마랑 아빠가 성숙해졌대요. 그래도 저 자신을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빨리 찾고 싶네요.
LE: 이제 앨범이 나왔으니까, [ANGELS]를 들은, 그리고 앞으로 들어주실 분들께 이런 앨범이니까 어떻게 들어달라 한 마디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거만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올해 들은 한국힙합 앨범 중에 [ANGELS]가 제일 좋구요. 정규 앨범을 많이 안 내는 시기에 낸 거에 대해서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작업했으니까. 올해의 앨범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LE: 마지막으로, 2000년대 미국 힙합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이 앨범을 갖고 2000년대로 돌아갔을 때, 누구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으세요? 얘는 무조건 좋아하고, 먹힌다.
아, 먹힌다요? 무조건 좋아할 거 같다? 칸예 웨스트가 좋아할 거 같은데요. ‘얘 누군데 나랑 비슷하게 하려 그러지?’ 그럴 거 같아요. 어떤 동양인, 아시안 애가 2000년대에 랩한다고 와서 플로우를 자기처럼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보면서도 호감으로 생각할 거 같아요. 트레비스 스캇(Travi$ Scott)도 칸예 웨스트가 자기랑 너무 똑같아서 같이 하게 된 거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 Melo, GDB(심은보)
사진 | A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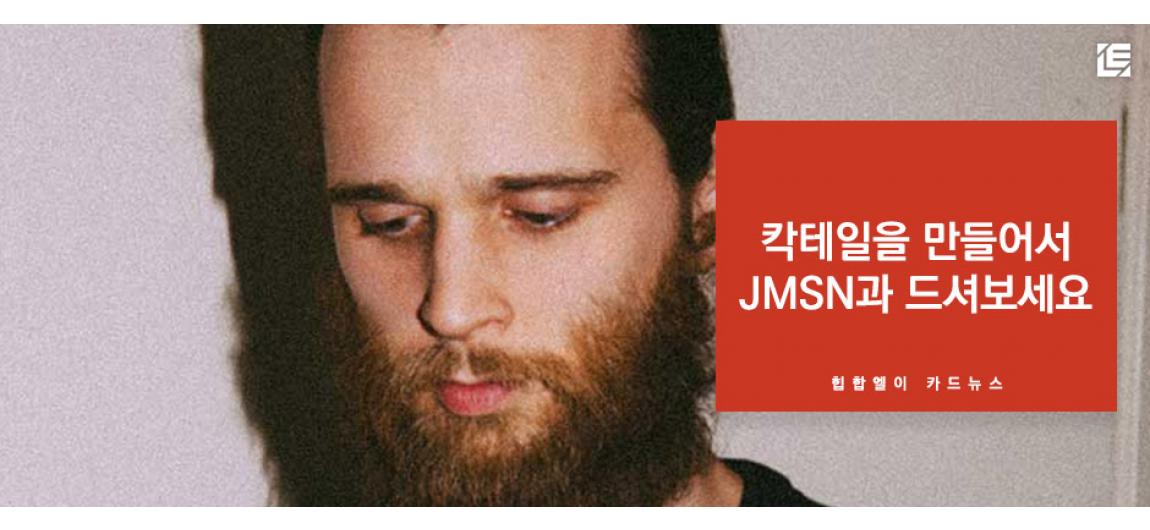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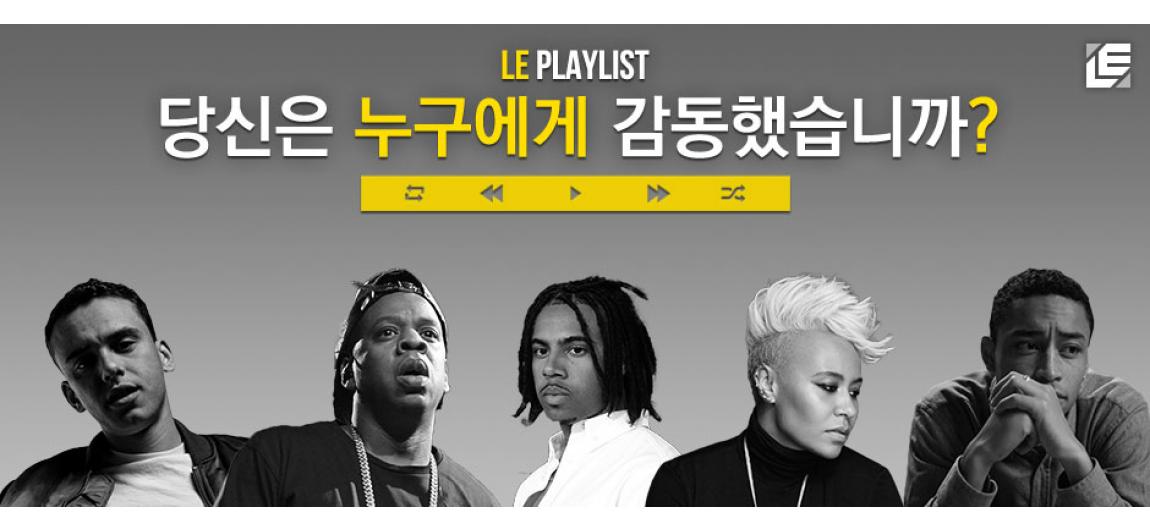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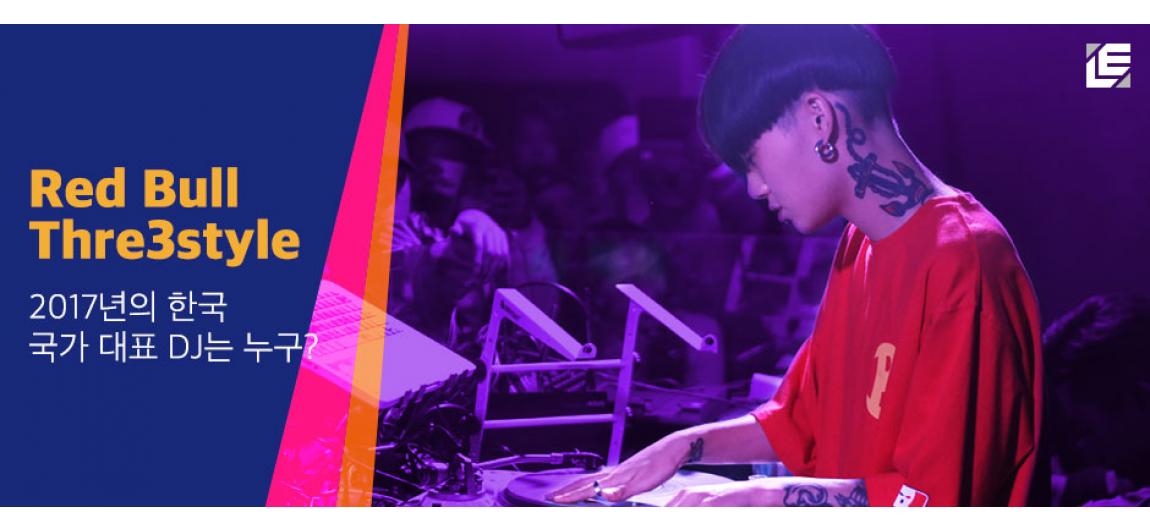





다 떠나서 순수히 청각적인 관점에서 랩을 듣는 재미 자체가 너무 좋은 앨범이었습니다.
Fly High에서의 래핑에서 느낀 짜릿함은 개인적으로 올해 국내힙합 랩을 들으면서 느낀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댓글 달기